| |
 |
|
| ▲ 이원우 기자 |
20년 전의 신문기사를 검토하다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에 놀랐다.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으로썬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이 논란이 일었던 것은 1995년 8월 하순이었다.
당시 중국은 지하 핵실험을 강행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까지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반면 한국 외무부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이 다 나온 뒤 온건한 논평을 내는 수준에서 그쳤다.
여론은 비등했다. ‘한-중 수교가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 강한 항의를 하기 껄끄러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게 대다수 언론들의 논조였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 속에서 결국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戰勝節)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 반대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6‧25 한국전쟁 때 한반도를 침공해 목전까지 갔던 남북통일을 무산시켰던 중공군을 사열한다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논지였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세르비아, 남아공, 수단,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 원수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건 분명 색다른(?) 체험이긴 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이 앵글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 |
 |
|
| ▲ 더욱 놀라운 건 이번 열병식을 보도한 한국 언론들의 ‘전향’이다. 20년 전과는 달리 중국에 각을 세우는 논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연예인 행적 보도하듯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
더욱 놀라운 건 이번 열병식을 보도한 한국 언론들의 ‘전향’이다. 20년 전과는 달리 중국에 각을 세우는 논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연예인 행적 보도하듯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놀랄 일은 아니다. 미국보다는 중국에 관심이 많은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요청하던 사람들조차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대국에 대한) 현실적 태도’를 주문하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할 수 있다면 ‘미국이 만든 세계(The World America Made)’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인 로버트 케이건이 2012년에 펴낸 책을 아산정책연구원이 올해 번역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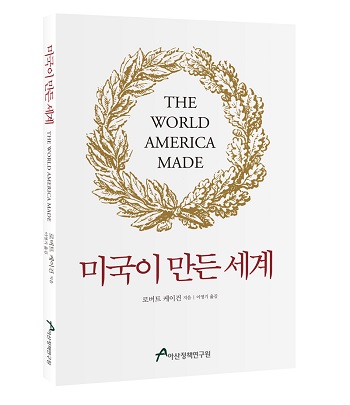 |
|
| ▲ 미국은 단순히 하나의 강대국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정립했다는 점, 따라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곧 현대문명 그 자체와의 접속을 유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게 이 책의 논지다. /사진= '미국이 만든 세계' 표지 |
미국은 단순히 하나의 강대국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정립했다는 점, 따라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곧 현대문명 그 자체와의 접속을 유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게 이 책의 논지다.
“양차 대전 기간 동안 자유시장 질서를 지탱할 능력과 관심, 열망을 지닌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그러한 역할을 떠맡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자유시장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그 질서는 소련과 중국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국가들에만 적용됐다. 이처럼 자유경제 질서는 하나의 선택이지, 진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것이다.” (p.50)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극소수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절대빈곤 상태의 한국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이 책은 그 통념을 깨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자유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담당한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밝혀낸다.
200쪽도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의 이 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친중 노선에 균형을 잡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 본다. 미국과 중국을 G2라는 수식어 속에 묶어두고 저울질 할 수 있는 자유조차 사실은 ‘미국의 만든 세계’의 산물일지도 모른다고 로버트 케이건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