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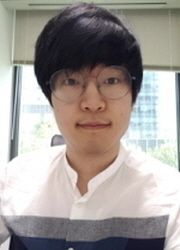 |
|
| ▲ 신한울 3·4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원자력발전 중심에서 가스터빈·재생에너지 등 일명 '친환경' 산업으로 옮겨가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두산그룹이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지만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이날 두산중공업에 1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따르도록 주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의 입장문을 보면 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수소경제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주목 받고 있는 발전산업이 나열됐지만, 채권단은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에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계획과 포트폴리오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했고 이같은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두산중공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지금까지 경쟁력을 갖춰왔던 분야를 정리하고 진출이 힘든 분야로 회사를 몰아넣는 등 기업 생존에 더욱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채권단이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종용 또는 방치한다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비롯한 목표 달성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 독자개발에 성공했으며,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2023년부터 주력 모델 'DGT6-300H S1' 상업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7%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너럴일렉트릭(GE)·지멘스·미쓰비치히타치파워시스템(MHPS) 등 기존 기업들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걸음마 단계인 두산중공업이 이같은 성과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400MW급 가스터빈을 상용화한 데 반해, 두산중공업은 270MW급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 |
 |
|
| ▲ 탐라해상풍력발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사진=두산중공업 |
풍력 역시 미국·덴마크·독일·일본업체 등이 두산중공업보다 수익성 높은 장비를 무기로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고, MHI베스타스를 비롯한 업체들이 10MW급 발전기를 내놓는 동안 아직 8MW급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점유율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
이같은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한 트렉레코드를 쌓아야 하지만, 입지규제·주민반발 등으로 보급도 늦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각국 경제상황 악화 및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글로벌 신규 설비 전망치가 두 자릿수 가량 떨어지고 있다.
태양광사업도 이미 국내에서만 한화큐셀·현대에너지솔루션·효성중공업 등이 활약하고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글로벌 설비 가격이 20% 급락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야구선수로 전향했다가 마이너리그에서 초라한 성적을 남긴 채 농구코트로 돌아와서 또다시 우승을 차지한 사례는 잘하는 종목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케이스로 유명하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의 한 임원도 국회에서 "협력사들도 업종 전환을 시도했으나, 성공사례가 드물다"고 말한 바 있다. 두산중공업 혼자서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군다나 이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두산솔루스 등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자산을 매각한다면 포트폴리오 전환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버텨낼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채권단의 현실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