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승 체험기 ①]시동부터 '진땀'…환경부·서울시 떠넘기기 '핑퐁게임'
필수품 '충전용 회원카드' 발급 안내 혼선…미발급 시 충전 불가
환경부·서울시, '전기차 보급 사업' 생색, 회원카드 발급 사항 '난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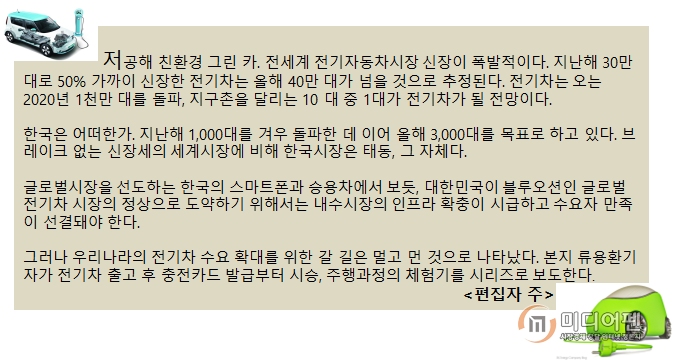 |
||
반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공약으로 전기차 보급에 앞서겠다고 강조했을 뿐 가장 중요한 카드 발급 안내는 자동차 제조사 책임이라며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
 |
||
| ▲ 전기자동차 충전기 투입구. | ||
24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이용자는 현재 3100여명으로 전국에 등록된 전기 충전소(급속·완속 포함)는 235개가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전기차 182대에 이어 올해 63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2000만원(환경부 1500만원·지자체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4250만원 상당의 A사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아 절반 가량의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를 상용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필수 사항인 충전용 카드 발급 안내 사항은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14년도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방안에서 카드 발급 사항에 대한 대용은 제외됐다. 안내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용 카드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된다.
이같이 중요한 내용을 서울시가 알리지 않자 차량 이용자는 제조사로부터 전기차를 인도 받더라도 제대로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기차 이용자인 회사원 A씨(34·여)는 “작년에 서울시 전기차 보급사업에 지원했고 보조금을 받아 최근 전기차를 인도 받았는데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발급 안내는 전혀 듣지 못했다. 충전소 이용 방법만 안내할 뿐 가장 중요한 카드 발급 사항은 외면했다”고 토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와 차량 제조사가 카드 발급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용 카드 발급은 차량 제조업체가 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
| ▲ 전기차 충전용 회원카드. | ||
서울시 대기관리과는 “제조사에서 (전기차 충전용 카드 발급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되는 사항을 이제야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지원자 수백명이 몰려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자축했다.
전기차 제조사 대리점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 이용에 관한 카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알려주지 않고 안내하라는 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무상 자신들이 카드 발급 사항을 일일이 안내하지 못한다며 제조사가 아닌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또는 추첨할 때 (발급 사항을) 설명을 다 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일일이 다니기 힘들어 지자체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용 카드 발급은 차량 제조사와 상관이 없다. 지자체를 상대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구촌 전기차시장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해 30만 대를 돌파한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전년동기대비 신장률은 49%. 전기차는 올해 40만대가 판매 예정이다. 전세계 전기차시장에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사적인 기술개발과 판촉에 올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겨우 1,000대를 넘은 데 이어 올해 3,000대로 예측된다. 지구촌 판매량의 1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걸음마 단계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에 대해 세제와 보조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저공해 친환경이라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사용자는 출고 부터 어떻게 주행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걱정한다.
시장은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을 믿고 편리하게 주행토록 하는 행정서비스를 원한다.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라 사용자를 헤아리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다. 글로벌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는 전기차시장의 내수 창달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출고 현장부터 확인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