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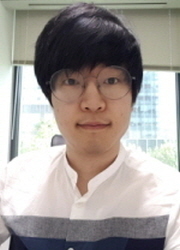 |
|
| ▲ 나광호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RPS) 상한을 25%까지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태양광·풍력 등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의무비율은 9%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상한선이었던 10%를 넘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에 따른 발전사 및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구입에 1조6101억원을 투입했다. 구입단가는 kWh당 79.70원으로, 원자력 대비 20원 가량 높았다.
그러나 이는 RPS 관련 비용이 빠진 것으로, 이를 포함한 실제 지출은 3조원대 중반에 달하는 상황이다. 의무공급비율 7%에서도 RPS 비용이 2조원이 넘은 것으로 고려하면 25%가 현실화될 경우 전기요금 급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132조원을 돌파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지난해 개정된 전기요금 체계는 RPS 비용 등을 총괄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와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재생에너지 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부담 확대 요소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구입단가는 2015년 kWh당 99.51원에서 2016년 88.22원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99.30원)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그렸다. 지난해의 경우 90원대로 출발해 하반기 들어 50~60원대로 감소했으나, 올 초 다시 80원대로 높아졌다.
호남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비롯해 수용성 문제도 여전하다. 발전설비의 경제성 뿐 아니라 폐블레이드 및 패널 등으로 인한 환경 이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
 |
|
| ▲ 미국 LA 유니버셜스튜디오 내 설치된 태양광 패널(왼쪽)·댈러스 DFW 공항 인근 풍력발전기/사진=미디어펜 |
재생에너지 판매 채널 확대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발전설비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비효율성 증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애로사항 접수채널'을 신설했으며, 정부와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너지공단·한전·태양광산업협회·풍력산업협회 등이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전이 설비보강에 비용을 투자하는 등 접속 대기율을 22%까지 낮췄으나, RPS 상한 조정에 따라 계통 추가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람이 불고 해가 떠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출력을 제한하거나 가동을 멈추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4회였던 제주 지역 풍력발전기 가동 중단은 지난해 77회로 많아졌으며, 최근 들어 태양광 발전소도 셧다운되기 시작했다. 전남 등 육지에서 발생한 잉여 전력을 소화하면서도 지역 내 남는 전력을 타지로 보내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비용 문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급은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하지만 당위성을 앞세워 현장의 볼멘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될 것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